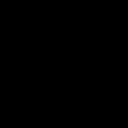한 사람과 마주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. 저는 인물을 찍는 사진가입니다. 그렇기에 꼭 만나 순수하게 카메라에 담고 싶은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. 그런 작업은 상업 촬영이 아니라서,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불러내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습니다. 민폐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. 하지만 욕심이 앞서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느냐고 종종 물을 때도 있습니다.
우린 무슨 사이도 아니고, 일면식 하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글로 마음을 전하곤 합니다. 글을 보내는 건 나만의 일방적인 소통이기에, 부담스럽지 않도록 길지 않게 진심을 추려냅니다. 전하고 싶은 마음이 묻힐까, 글의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, 몇 번을 다시 읽어보기도 합니다.
어떤 날은 첫 문장도 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. 수많은 단어 중에 어떻게 우리의 시작점을 만들지, 너무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닌지 서성거릴 때도 있습니다. 당신을 만나고 싶다는 진심은 그럴수록 더 확고해집니다. 그런 진심은 빗물처럼 점점 불어나는데, 불어난 진심을 어쩌면 좋을지 허둥대는 내가 밉습니다.
때로는 내가 지나치게 로맨틱하다고 생각합니다. 나는 이렇게나 당신을 원한다는 일종의 고백일까요? 나를 모르는 당신에게 보내는 프러포즈? 이 얼마나 뜬금없는지. 어느 날은 뜨거워진 낯으로 글을 모조리 버리기도 했습니다.
그렇게 몇 번을 망설이다 다시 단어를 고릅니다. 당신이 내 글을 읽는다는 보장도 없으니까,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반대로 운 좋게 내 글이 거기까지 닿는다면, 당신은 이런 내 모습을 보는 몇 안 되는 사람일 테니, 오히려 행운일거라고. 이 시간, 망상은 망상을 거쳐 괜한 자존감으로 변합니다.
몇 날이 지나면, 놀랍게도 답장이 올 때가 있습니다. 대학 합격 발표처럼 들뜬 마음에 글을 읽으려는 순간, 내 자신이 괜스레 창피하여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. 결국 당신과 카메라 앞에 마주하게 됐을 때, 그제야 실감합니다. 앞으로도 나는 당신께 글을 보낼 거라고. 당신은 나를 나로서 있게 해준 사람이니까.